지적이면서 직관적이고 시적이지만 미니멀하지 않게 작가의 삶과 사랑에 관한 견해를 적나라지만 따갑지 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작가는 일상을 특별한 화면에 완벽하게 담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할까요
책장을 덮으면서 은밀하게 올라오는 희열감이 느껴지는 책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서두를 읽으면서 포기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뭐야라는 의문의 감정으로 갈등을 하게 합니다. 평범함을 거부한듯한 작가의 창작의 세계를 고민하면서도 아치 굴곡을 타 내려가듯 읽어 내려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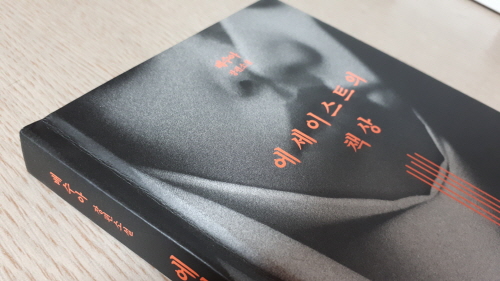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많지 않고 글의 흐름도 여백이 많아 보이는데 장소와 시간을 거스르거나 다시 찾아왔을 때 머릿속은 투명하지만 뭔가 복잡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소설은 공간과 시간을 함께 만지지만 특히 시간을 다루며 각 인물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작가는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창작을 하고 언어를 유희하는 자유를 느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유 안에서 영혼, 창작, 관계, 관련, 흐트러짐이나 욕구, 시선, 대상에 대한 감정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색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는 완벽주의자로 보입니다. M은 그런 작가가 진정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여 완벽한 모습을 표출하도록 직시하고 인정하고 감성 상태 그대로를 흡수하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점점 내가 아니었고 M은 점점 M에게서 멀어져 갔다" 영혼까지 끌어내 보여주는 작가 안의 아름다운 사랑은 우월감이나 특별함이 아닌 본질에서 추구하는 당연함과 정직함으로 단순하지 않고 진정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여성이든 남성이었던 간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관계에 관한 사랑 이야기는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하나의 시간에 집중할 때 완벽한 사랑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100% 순수한 사랑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느껴졌던 건 작가는 M과 주인공 사이에 대해서는 독자가 상상하고 추론하고 각자 의미로 받아들여지게하는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M의 본질, 두 사람의 거리, 감정의 갈등, M의 빈 공간에 대한 독자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수미를 M이라고 생가할 수는 없었다. M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미덕으로 칭송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라며 이어지는 일상에서 다른 존재로부터도 계속 찾고 비유하는 M의 존재에 대한 설명과 그리움이 독자들을 다시 상상하게 합니다. 같이 있을 수도 헤어질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랑을 전쟁 같은 사랑으로 번뇌하는 고혹한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작가는 음악 소재로도 M의 대해 설명하고 상상하게 합니다. 음악의 상징성을 빌어 특히 바흐의 클래식 곡들의 기원에 관련하여 주인공과 M에게 추구하는 사랑에 대한 배신과 비극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으며.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도 결정적인 시련과 헤어짐에 대한 묘사와 그리움과 이별로 인한 절망감을 그리고 있으나 모든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M을 다시 생각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클래식이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의 상징성 중 비극을 자유로움과 신비감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글에 집중하게 합니다.
책을 덮으면서 느끼는 희열감은 'M은 주인공 자신이겠구나'입니다. M과 언어와 음악으로 소통했지만 나중에는 언어와 음악의 도움 없이 M과 하나 되는 동일시에 대해서도 분명 말하고 있고 자기애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애가 나르시시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이 생각하는 완전한 사랑 자체에 대해 M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표제부터 작가의 예측할 수 없는 지식과 감성의 깊이만큼 모든 것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명쾌한 한 줄의 설명은 분명 어렵습니다. 상식도, 타인도,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여 조금 어긋나 비껴간 시선만이 M과 작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kbs우리시대의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효서 풍경소리입니다. (0) | 2021.11.07 |
|---|---|
| 성석제 소설집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0) | 2021.10.30 |
| 김원일 작가 장편소설 마당 깊은 집 입니다. (0) | 2021.10.16 |
| 최은영 소설 쇼코의 미소 입니다. (2) | 2021.10.11 |
| 윤후명 소설 모든 별들은 음악소리를 낸다 (2) | 2021.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