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첵 뒷부분 비평란에 정홍수님이 쓰신 내용처럼 '우리는 멀리는 전태일의 죽음으로부터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노동의새벽]을 생생한 이념으로 하고 있는 '노동문학'의 역사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진행하는 역사성을 감당하면서 노동 현장의 투쟁하는 일상을 그려낸 것이 방현석의 문학이었다'에 공감 하면서 짧은 소설이지만 시대를 아우르는 넓고 깊이 있는 내용의 소설이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차근차근 풀어내 봅니다.
우선 방현석의 창작의 힘은 어디일까 생각해 봅니다. 방현석 작가는 현실, 추억, 아픈기억을 소재로 쓰고 있지만 자기만의 긴장은 내려놓고 실제 이야기 노동자들의 눈물을 잘 닦아주면서 각인된 자본사회의 이야기를 더 인간적으로 쓴 소설이었기에 문학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빠르게 어떤 부분에서는 느리게 독자가 체험하면서 이미지를 그리고 상황을 겪게하는 흐름은 겪한 음악 한곡을 듣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잔인하지 않으면서 잔인하고 긴박했던 내용은 주인공 여성 노동자들 미정 민영 순옥 철순이 맞았던 쌀쌀한 겨울날씨를 그대로 느끼게 했고 손끝이 아려오는 착각을 이르킵니다. .
소설의 시작은 한 공장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작업 라인을 두개로 분리했고 서로 작업 경쟁을 시키므로 노동자들은 혹사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한 피로감은 상대 라인의 노동자들을 비난하게 만드는데 이 일이 노동자들 스스로가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책의 초반부터 이야기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쟁은 양측이 구분이 안되는 모습으로 스토리를 위해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글에서 만큼은 가볍지 않고 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때 수용이나 설득의 과정은 없었고 공장의 부속품처럼 이거 아니면 저걸로 대체되는 처후를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수용하고 협상의 과정은 없이 떠나거나 사라져가는걸 보아야 했는데 그 상황을 당연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힘의 구조와 사회적 모순과 인식의 부재가 가장 컷을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남성 중심의 노동자와 여성중심의 노동자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이루어 독려해주는 과정입니다.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같은 길을 바라보고 투쟁하는 과정이 처절하게 아름다울 뿐이었고 위장폐업과 기업의 비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어떤 형태로도 미화될 수 없는 상황임에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거스를때 격하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타협이 어려워지고 투쟁으로 이어지는데 책의 인물들은 투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활이 있는 대단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자리가 있었고 각각의 몫으로 짜여졌던 투쟁의 흔적은 이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있는데 투쟁의 흔적은 봉인된 시간처럼 간직되어 지금 우리시대에까지 이어져 언제든 봉인을 풀수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 또 하나의 특징은 영화나 음악처럼 스토리에 감정을 실어 독자가 감정이입이 되는 과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주인공 노동자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몸의 움직임으로 호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만들어진 각본이나 논리는 없습니다. 큰 윤곽을 드러내는 탁월한 연기의 주인공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몸을 통해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들의 요구를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었기에 이야기의 진솔성이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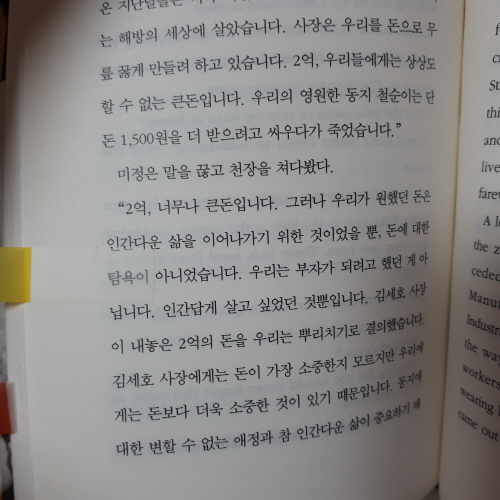
시대를 인간의 성장기로 나누어 생각해본다면 1980년대는 우리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더 기계같았고 복제된 로봇처럼 일을 해야 했던 시절의 부조리함을 벗어나려했던 노력이 지금에 우리를 만들었던 유년시절의 모습입니다. 아프지만 아름다웠던 시절로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시절이었고 지금도 변화를 위해서 투쟁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하며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kbs우리시대의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은희경 장편 소설 새의 선물 (0) | 2021.07.26 |
|---|---|
| 깔끔하고 흥미롭고 이상한 이야기 김승옥의 무진기행 (0) | 2021.07.19 |
| 사람을 대할 때 조금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던 중 읽게 된 경애의 마음 입니다. (0) | 2021.07.06 |
| 윤대녕 작가를 알고 은어낚시통신 을 이해하다 (0) | 2021.06.27 |
| 은어낚시통신 읽고 있는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글쩍 글쩍~ (0) | 2021.06.23 |